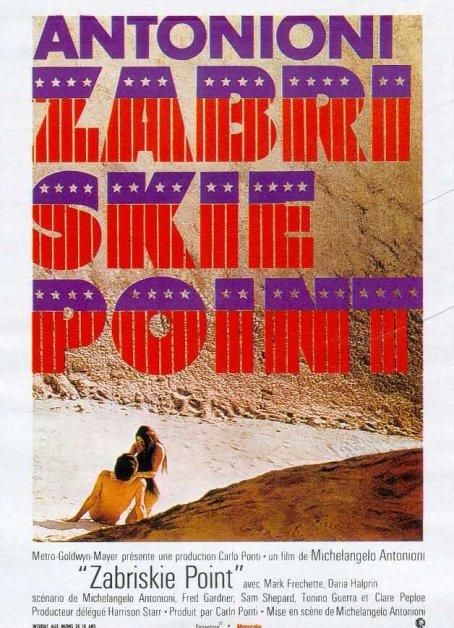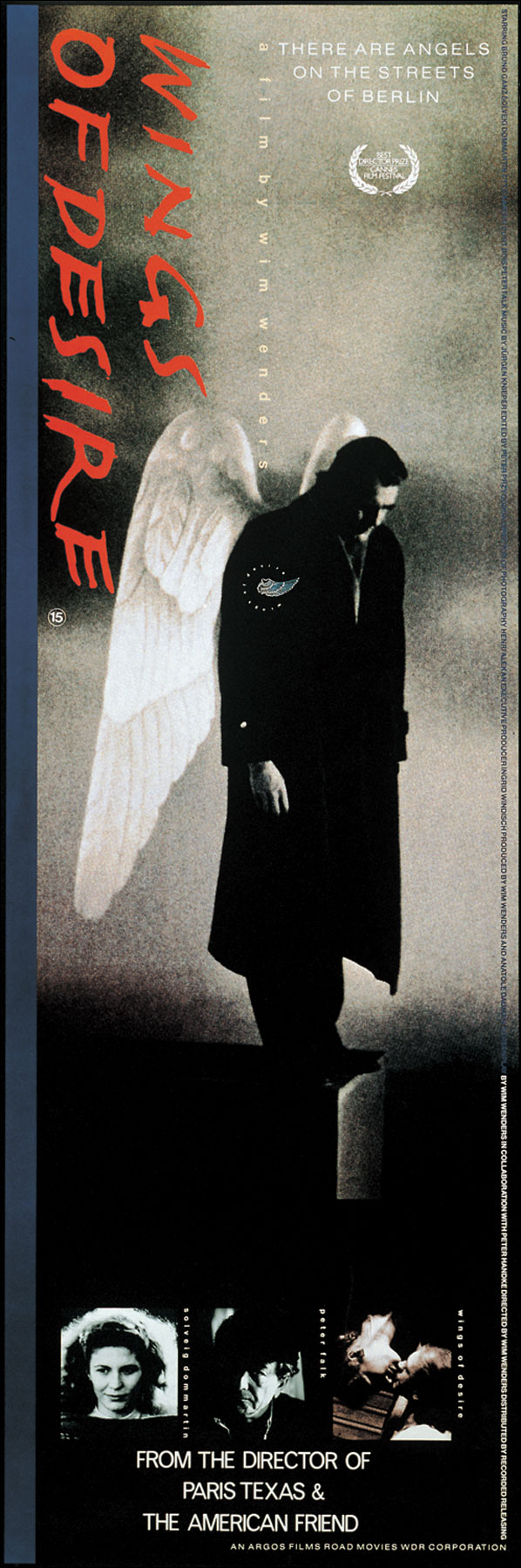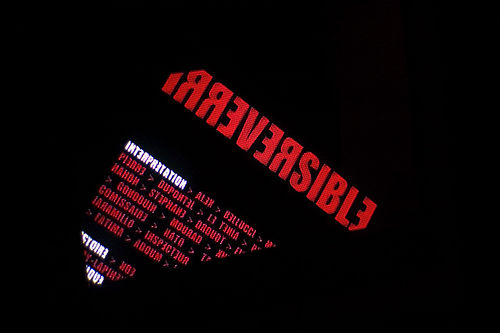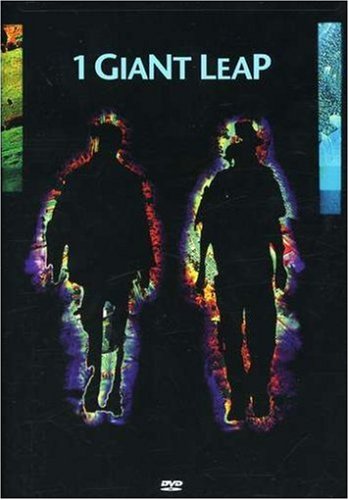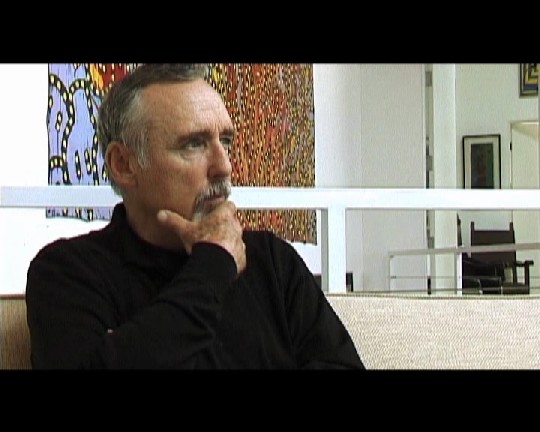Ambient: Film & Electronica 06
함께한다는 것의 즐거움 [Utatama 노래혼]
(http://electronica.tistory.com)
사회 생활은 생존을 위한 각개전투다. 물론 하나의 집합체로서 다수에 의한 결과물을 내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 끝없는 양육강식의 전쟁터라는 관점에서는 그리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어찌하였건 이렇게 인간이 사회로 나오기 전 우리는 여러 과정의 학생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교의 경우 사회 진출 전 관문으로서 어느 정도 개인의 주체와 독립성이 더 부각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인이 경험하고 견뎌나가야 하는 단체생활의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러한 맥락 속의 여자 고교생들의 생활을 다룬 두 음악 영화가 있다. 바로 스윙걸즈와 우타타마 (노래혼). 중고등학생 소년 소녀 만이 가질 수 있는 꿈, 열정, 역경을 담은 영화들이다.
각각 음악 활동 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고생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된다. 하지만 영화의 완성도나 전개, 연기 등 모든 면에서 역시 우타타마는 스윙걸즈에 못 미친다. 우선적으로 스윙걸즈는 뛰어난 감성을 가진 야구치 시노부의 탁월한 연출을 바탕으로 오로지 영화를 위해 노력한 배우들의 실제 퍼포먼스 등, 우타타마가 상대하기로서는 큰 벽이다. 더군다나 우타타마의 원톱으로 등장하는 여배우 카호는 곽광받고 있는 신인이긴 하지만 그 동안 쌓아왔던 그녀의 ‘시골’스럽고 ‘순수’한 이미지에 만화 캐릭터를 떠올리는 벙찐 캐릭터를 너무 작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억지스러움까지 보인다. 고로 여러 영화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우에노 쥬리와 다른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하모니를 넘어서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스윙걸즈 영화의 완성도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타타마를 못 만든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다.
우선 두 영화는 비슷하지만 재즈와 합창이라는 서로 다른 음악적 요인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이끌어 나간다. 또한 스윙걸즈가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고뭉치 집단이 억지로 밴드 부에 들어가 흥미를 가지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타타마는 재능과 열정은 뛰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외모와 우월감을 주체 못하는 소녀가 우여곡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음악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단체 생활에 대해 적응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윙걸즈가 가장 대중 적인 재즈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글렌 밀러나 베니 굿맨 중심의 스윙재즈를 메인 사운드로 내세우며 전형적인 일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좀더 폭넓은 관객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반면 우타타마는 80,90년대의 스타 가수였던 오자카 유타카를 내세우며 좀더 일본 대중문화 안에서의 향수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혹은 알기 쉬운 대중 가요의 사용과 악기 사용이 아닌 바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타타마의 핵심이자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이끌어내는 요소다.
우타타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카호가 독백으로 “작은 기적”이라 부르는 ‘때창’ 씬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물하기에 충분한 장면이다. 오자키 유타카를 시작으로 마지막 피날레인 몽골800의 ‘아나타니’ 까지 마치 시골에서의 뜨거운 한 여름을 시원하게 장식해주는 매미들의 합창처럼 서로 다른 연령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하나로 싱크(동조/동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스윙걸즈처럼 이들이 밴드였다면, 관객들이 허밍으로 따라 부르거나 락 밴드의 보컬을 따라 부르는 식이였다면 이러한 복잡하게 얽힌 요소들의 싱크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그 콘서트 홀의 모두가 일어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음악을 같이 부르는, 전혀 유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카타르시스를 일궈낸다. 이 음악 씬 하나만으로 엉성하게 전개되었던 내러티브의 나쁜 기억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 친구들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차 안에서 누군가 흥얼대는 혹은 틀은 음악을 하나 둘씩 따라 부르며 그 몇 일간 혹은 몇 시간 동안의 경험을 정말 적절하게 표현해주었던 그 싱크의 경험!
군대나 옛 학창 시절 죽어라고 불러대던 애국가나 80년대 기업 문화였던 매일 아침 국민체조와 같은 경우 이러한 유대감 형성을 프로파간다 식으로 주입시켜 시스템 속에 가두어 버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문화에 대한 경계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결국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특별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란 것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한다.
몽골800의 ‘아나타니 (당신에게)’가 끝나갈 무렵 카호 특유의 함박 웃음 속에서 마지막 모놀로그가 흐른다,
“이런게 바로 하모니구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거구나!”
MoPiX 青春合唱映画『うた魂♪』夏帆&ガレッジセール・ゴリに直撃!
아나타니 원곡 몽파치
우타타마 예고편
** Bling의 AMBIENT 컬럼은 [우타타마]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이번 호부터는 다시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중심으로 한 컬럼으로 돌아갑니다 ^^
'MUSIC > Bling_음악컬럼_Ambi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F&E05: Do Another Teen Movie! - 2000년 이후 틴에이지 영화 사운드트랙 (0) | 2009.04.01 |
|---|---|
| Ambient04: F&E: 우리의 지난 날은 진정 화려했나 -- [버블로 고],[카치3부작] (0) | 2009.03.16 |
| Ambient: F&E 03: Saturday Night Disco Fever (0) | 2009.02.04 |
| Ambient: F&E 02: 도시의 음악들 (0) | 2009.01.03 |
| Ambient 01: 1 Giant Leap (0) | 200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