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erlink를 통해 좀더 나은 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아직 연재 중인 컬럼이니 잡지와는 시차를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퍼가시게 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07년 2월자
PLUR and Vibe Upon the World 05:
(Bye 80s Hello 90s 2) We Will Rock U All Night Long
Electroclash 는 온갖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지만 Electro와 Synth의 재 탐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클럽/ 레이브 문화의 한줄기 빛이다. Electroclash의 창시자인 Larry Tee가 뉴욕 문화를 망쳐놓은 빌어먹을 인간 3위로 뽑힌 2004년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전자 댄스 음악 문화는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일까?
80s Revival House, Ministry of Sound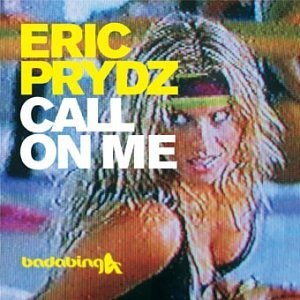
이 서막을 울리게 된 것은 바로 2004년 발매 되자 마자 5주간 영국 댄스 싱글 넘버 원을 차지했던 에릭 프리즈Eric Prydz 의 'Call on Me' (Live 버젼 클릭) 다. (프리즈의 믹스에 넋 나간 원작의 주인공 스티브 윈우드는 새로운 보컬을 만들어 주었고 Ministry of Sound 선정 올해의 Sexiest Music Video로도 선정되었다.) 에어로빅을 주 테마로 한 이 뮤직 비디오는 80년대 요소로 가득 차 있다. (붐 박스와 카세트 테이프, 헤어 밴드, 라이크라와 줄무늬 의상, 레그워머 그리고 80 년대 특유의 화려한 원색 등) 더 나아가서는 Ministry of Sound의 신 사업인 (일종의 '몸짱' 붐을 위한) Fitness와 맞물리게 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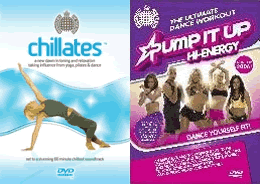
하지만 클럽 하우스 음악에 있어 진정한 80년대 복고 사운드는 2002년의 ‘So Much Love to Give’를 뽑을 수 밖에 없다. 주인공은 바로 80s 사운드의 끝없는 재 탐구를 해왔던 Daft Punk의 Thomas Bangalter다. 클럽 음악을 통한 진정한 유포리아(Euphoria)를 느끼고 싶다면 들어보라. 클럽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이 튠이 흘러나온다면 분명 당신은 그날의 DJ에게 평생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전자 댄스 음악계의 영원한 이단아라면 바로 Happy Hardcore를 들 수 있다. 아무도 그 음악적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 조차 기울이지 않는 독특한 문화다. 하지만 이 장르도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은 Freeform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 쿨' 함을 중요시하는 미디어가 그 특유의 '유치함 '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Wigan Pier 는 클럽 산업의 침체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몇 안 되는 클럽 중에 하나다.
Wigan Pier 의 사운드는 Happy Hardcore 식의 90 년대 anthem 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서는 old skool 또한 90년대 anthem이다 )여기에 모이는 이들은 주류 클럽 문화에 속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자유분방함 '을 내세운다. 이 씬을 막말로 표현하자면 미친 망아지들이 날뛰는 현장 같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특정 DJ나 미디어 또는 프로모션에 의해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분위기를 찾아 서로 모이는 것. 그 옛날처럼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꿔 버릴 만큼 큰 충격은 주지 못할지언정 다양함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좀더 편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통해 침체기 라기보다는 성숙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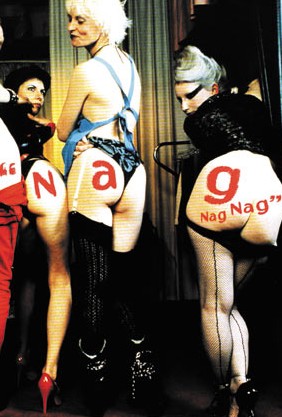
80 년대 Electro 그룹 Cabaret Voltaire 의 음악에서 이름을 따온 이 클럽 나이트는 주로 양성애/게이 /고딕 등 다양한 서브 컬쳐 인파가 주를 이룬다. 70, 80년대 일렉트로, 팝, funk 의 playlist 들은 얼핏 보면 electroclash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선전적인 hype을 뺀 순수하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일렉트로와 punk 요소가 더 가미되어 또 하나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Nag Nag Nag 나이트의 중심 인물인 Johnny Slut은 electroclash와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지만 시기적인 측면 등을 볼 때 둘의 연관성은 깊다. 2000 년에서 2002 년 사이 뉴욕과 베를린을 중심으로 무섭게 성장하던 일렉트로클래시 신의 중심에서 런던의 공백은 미디어들을 불안하게 했다. (아무리 hype 이라지만 세계 댄스 음악의 중심이라 자처하는 런던에 꼽을 만한 일렉트로 클럽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을까?) 어찌하였건 뉴욕의 Larry Tee 와는 조금 다른 노선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Batcave 나이트의 경험이 있는 Johnny Slut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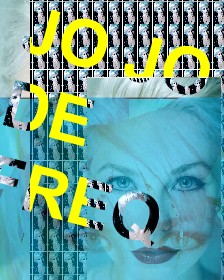
50,60명 정도의 규모에서 별과 몇 달 사이에 Nag Nag Nag 의 댄스 플로어는 몰려들어온 인파로 꽉 차게 된 것이다. 이 런던 클럽은 케이트 모스, 그웬 스테파니 , 보이 조지, 비욕 등의 주류 및 패션가 사람들의 잦은 방문으로 미디어의 덕을 보기도 했다.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면서도 싫증도 잦은 패션가 사람들은 곧 사라지긴 했지만 오히려 클러버들은 이 시점부터를 더 즐겼다는 후문도 들린다.
Nu Rave:
지난 10월경 NME 지가 새로운 장르를 선포했다. 이름하여 "Nu Rave." (80년대 말과 90 년도 초에 성행했던 레이브 문화와 그 동안 자라나고 있던 electro-rock (혹은 dance-punk) 의 크로스오버다. 그 즉시 언더 음악 관련 유명 블로그들은 일제히 우려와 반감의 목소리를 높이며 술렁였다.
요점인 즉 자신들만의 언더문화가 미디어의 횡포에 휘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이 블로그들도 NME 와 같은 거대 미디어가 없이는 언더 밴드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발돋움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무리 한 아티스트가 영원한 '언더'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꾸준한 성숙과 성장을 위해 주류로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시 새로운 사운드로 대체된다는 것. 일종의 반복되는 사이클이다. 하지만 이 블로거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사이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막 자라려고 하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문화를 구태여 끄집어내어 장르를 선포하고 과대선전하고 결국엔 1년도 안돼 그 장르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 'xx 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oo이다!'의 공식에 의한 그들의 언더문화의 요절이 눈에 뻔히 보이기에 이토록 흥분하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Nu Rave란 단어를 쓰며 이런 이야기를 끄적거리고 있는 것 조차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3,4개월의 시점을 두고 지켜보고 개인적인 느낌을 담는 정도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Nu Rave 는 대체 무엇인가? 음악 장르인가, 문화 현상인가? 확실치 않다. 요즘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옛 장르에 이름 덫붙이기 정도로 보면 된다. Nu Nu Wave, Nu Electro 등등처럼. 따라서 무작정 NME의 추천을 좇아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널리 퍼뜨리고 환영하는 짓 또한 위험할 수 있다.
어쨋든 NME 가 선포한 Nu Rave 가 장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덜 성숙한 것은 사실이다. 굳이 특징을 찾아보자면 락밴드의 3 요소인 기타, 베이스, 드럼에 신디사이저의 자리가 중요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electro-rock 혹은 dance-punk 라 불리는 타 밴드의 모습과 다를 것은 전혀 없지만 좀더 몽환적인 가사와 보컬, 그리고 레이브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들의 뮤직비디오나 파티씬을 보면 레이브의 아이콘인 스마일리 페이스, 배기 팬츠, 
NME 지가 Nu Rave를 선포하며 앞장세웠던 밴드, Klaxons 조차 자신들이 레이브라는 이미지를 통해 알려졌지만 어떠한 문화적 장르나 움직임에 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시점에 과연 Nu Rave 운운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Dance-Punk 에 대한 영국의 응답쯤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20년 만의 레이브의 부활과 락+전자음악의 재결합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면 우리는 Happy Mondays, New Order, Paul Oakenfold 등을 떠올리면 된다. 혹은 그 시절을 상상해 보면 된다. 락과 신스와 테크노 /하우스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사랑과 희열이 크로스오버되었다는 그 80년대에서 90 년대로 넘어가던 시점을 말이다. 왜 굳이 Nu Rave 라는 ' 장르' 적 굴레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가? 락커들을 위한 댄스 음악, 헤드뱅잉이 가능한 댄스음악, 글로우스틱을 돌릴 수 있는 락음악, 댄스와 락의 만남. 더 간단하고 포괄적이지 않은가? 굳이 레이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않다거나를 떠나서 한판의 신명나는 춤판 혹은 헤드뱅잉 판(?) 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점에 흥분 되는 것이다.
몇몇 밴드들을 살펴보자. 소개되는 모든 밴드의 공통점은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70,80 년대 펑크와 일렉트로 사운드의 부활의 흐름에 있다는 것과 춤 추기에 딱 좋은 락 -댄스 사운드라는 것이다. 또한 이 영파워들은 인터넷 세대인 만큼 미국의 싸이월드인 myspace 를 적극활용하며 자신들을 홍보한다. 비디오 구글이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들도 많은 만큼 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NME에 의해 Nu Rave 로 통해지는 Klaxons, Shitdisco, DataRock, New Young Pony Club 등은 아직까지 대중의 눈에 띄기에는 성숙하지 않은 사운드지만 (모자란 실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 다듬어짐' 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매력이고…) 앞서 말했듯 레이브 문화와 90년대를 향한 향수를 쉽게 느낄 수 있다. Techno sound를 중심으로 하는 Simian Mobile Disco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어찌하였건 이 90 년대 라이엇 걸들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밴드들의 등장은 반갑기 그지 없다. 일렉트로 신스 성향이 강한(일렉트로클래시의 MIss Kittin 이나 W.I.T 등) 밴드들은 소닉 유스의 킴 고든과 블론디의 끈적하고 퇴폐스러움을 떠올리는 반면 DeadDisco 나 Teenagers in Tokyo 같은 그룹은 바로 언급한 Sleater Kinney와 Bikini Kill을 연상케 한다.
또한 물방울 무늬의 원피스가 인상적인 피펫츠The Pipettes는 50년대 여성 코러스를 연상케 하며 직접적인 팝 사운드로 어필한다. 80,90년대 복고 이야기에 왠 뜬금없는 50년대 얘기냐 할 수 있겠지만 이들 또한 50년대 바비돌 이미지로 자신들을 포지셔닝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Riot Grrrl 의 에센스를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매력은 이들의 유치한 율동과 음악 속에 담겨 있는 흥겨움이 아닐까 한다. (펑크 밴드 Thee Headcoatees에서 퇴폐적이고 거친 요소를 배제한 그룹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복고의 약발은 이미 떨어졌다. 아마 2,3년은 지속되겠지만 작은 변화만이 있을 것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이라면 이미 90년대 복고가 도래했다는 것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짧은 지면 상 하나하나 꼬집어 설명은 못하지만 지금의 음악과 클러빙/레이브 트렌드는 이미 90년대로 넘어가고 있다. 2007년의 씬을 바라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Sasha, Digweed로 대변되는)정통 하우스 사운드 씬과 락-댄스의 크로스 오버 씬 중 누가 승자일 것 인가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80s Retro House Tune recommended
1. So much love to give by Thomas Bangalter
2. Call on me by Eric Prydz
3. Stupidisco by Junior Jack
4. I like love by Solitaire
5. Out of Touch by Uniting Nations
Rock-Dance Crossover (Nu-Rave, Dance Punk, Electro Rock, whatever…) recommended
1. Klaxons (rock, rave) -Majik
2. Datarock (rock, rave) - Fafafa
3. Deaddisco (dance punk) - Automatic
4. The Pipettes (surfing, candy pop) - Pull Shapes
5. Simian Mobile Disco (techno, electro) - Hustler (18세 미만 절대 클릭 금지!)
6. The Rapture (Dnace Punk) - Woooh Alright Yeah
'MUSIC > Bling_월드뮤직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lur & Vibe Upon the World 07_07년 4월자: Trance (3) | 2007.05.11 |
|---|---|
| PVUW 06: 07년 3월자___Coachella '07 (2) | 2007.04.25 |
| PLUR and Vibe Upon the World: 07년 1월자-Electroclash (3) | 2007.04.15 |
| PVUW03: The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at the Club, but now WHAT? (0) | 2007.04.12 |
| Plur & Vibe Upon the World 06년 11월 Money's Too Tight to Mention (0) | 2007.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