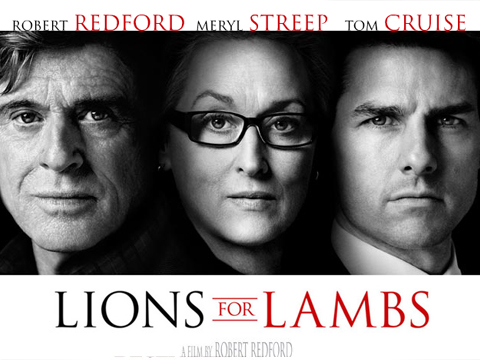엔딩씬
(엔딩 장면이 뭐가 될지 짐작할 수 있을만한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 있음)
크게 상관은 없을듯...ㅜㅜㅋ
...
Sexual Healing (Mercurius FM Soul of House Mix) by Marvin Gaye

개인적인 생각의 답은 "아니다"
영화 상 시대는 어느덧 신화와 영웅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크리스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에쿠우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호르스가 왕의 똑같은 스텝을 밟은 베오울프 또한 신화적 영웅으로서 육체의 쾌락은 금기시 되지 않는다.
그 또한 오딘을 신으로 섬기는 마지막 영웅이며,
이 신화의 영웅은 나약하고 고독하고 섬세하다.
하지만 크리스챤의 시대가 도래하며 변한 것은 무엇인가?
육체라는 것은 한 낫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천한 것이 되어버리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구원이라는 요소만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남녀 간의 (남남, 여여 간의 관계는 고사하고) 육체관계는 탐욕, 쾌락의 요소를 가짐으로서 금기처럼 여겨졌다.
오늘 날 현대 사회에서 꺼리낌없이 자신의 육체 관계를 말하는 사람을 보며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 이유다.

육체를 불사르며 끊임 없이 이어지는, 돌고도는 여행, 고독, 싸움을 통해 신의 경지로 오르게 되던 시대는 지고,
그런 힘겨운 육체를 버리고 정신적인 구원만을 기다리는 '나태(?)'의 시대에 올라선 것이다.
베오울프를 뒤를 잇는 위그라프는 더 이상 "아들-아버지" 관계로서 오른 왕이 아닌 친구로서, 동지로서 신화적 알레고리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인물이다.
따라서 이성적? 이상적으로 볼 때,
크리스챤니티와 함께 중세를 벗어난 접점기 혹은 그 시작에 선 위그라프는 분명 크리스챠니티가 중요시 여기는 '금기'에 대해 순응했을 것이다.

동시에 그렌덜의 어머니 괴물 또한 신화시대의 마지막 괴물로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프로이드가 등장 할 때에 맞추어 인간의 정신 속 혹은 심리 속에서 다시 부활 한 것이 아닐까...
--------
베오울프,
고등학교 영문학 시간에 어려운 고전 영어에 낑낑대며 읽은 기억만이 남아있다....
물론 내용이며 메타포에 대한 기억은 '클리어'되어 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주관적인 나름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더라는 주절주절....
--------
솔직히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지 않는 영상이었다...
그리고 가끔 300을 연상 시키는 시퀀스들도 그저그랬고...
그래도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스펙터클과 내러티브에 침 질질 흘리면서 보게 되었다는...

베어울프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영화 상에서) 신화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괴물, 팜므파탈, 애증의 관계...
이런 요소를 소화내기엔 뭔가 세련됨과 깊이가 모자른 캐릭터라고나 할까?
아니면 스칸디나비안의 냄새가 너무 나지 않아 어울리지 않을 것일수도...
갑자기 스칸디나비안에서 왠 라띠노+이딸리안 삘이 나는지... 이건 좀 삑사리 같다...
신화의 원조인 중동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중동삘을 원한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누가 어울렸을까?
밀라 요보비치는 영상 분위기 상 어울렸겠지만... 졸리보다 더 싼티가 팍팍 났을테고...
잘 모르겠다...ㅜㅜㅋ 암튼 졸리는 미스캐스팅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