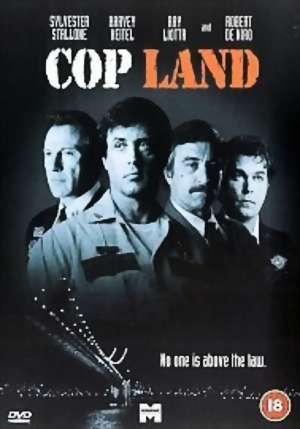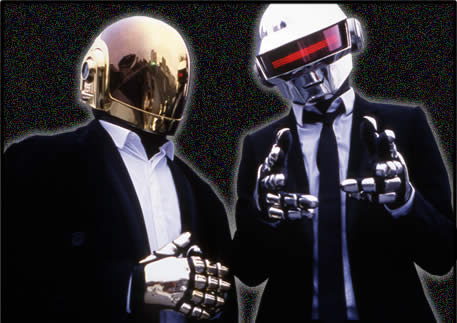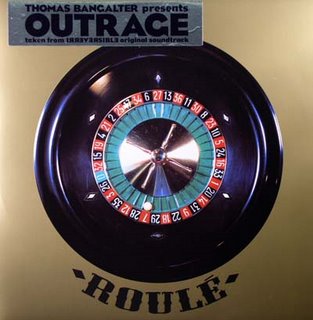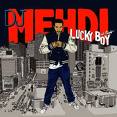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쓸 작품으로 까지 평가 받고 있는 추격자.
전 포스트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찬사를 늘어 뜨려 놓았지만 아쉬운 부분만은 분명 남아있다.
이 영화가 한국 영화가 국내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흥행 영화로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혀 새로운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쓸 작품이란 찬사를 붙이고자 하면 분명 '새롭고' '참신하고' '실험적'인 요소들이 어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경 삼림], [타락 천사]의 왕가위 영화나 프루트 챈 감독의 [메이드 인 홍콩]에서 볼 수 있었던 현대 홍콩이란 도시를 그려내는 방식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그러한 도시 공간 묘사 기법이 그저 한국이라는 실정으로 옮겨진 것일 뿐 90년대 추격이나 폭력을 소재로 하여 도시라는 공간을 묘사하는 외국 영화들에서 크게 다른 점이 보여지지가 않았다. 차라리 추격 영화의 고전이라 꼽히는 [프렌치 커넥션]을 한 번 더 보는게 나을 수도 있다.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에서 발견되는 식상함을 꼽을 때 지겨울 정도로 세련된 유럽 영화의 문법을 고스란히 고수하는 것을 뽑는데 [추격자] 또한 90년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외국 영화의 문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막말로 심형래의 [용가리]나 [디 워]가 우리도 SF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하여 외국 괴수 영화의 문법을 그대로 옮겨 놓고 실패한 반면 [추격자]는 그 반대로 추격 영화를 만들고 문법을 그대로 따르며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뿐이다.
그리고 좀더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봉준호의 [괴물]에서 간혹 나오던 '정치적' 조롱이라 불린 블랙 유머가 조금 직설적이고 촌스러웠던 반면 [추격자]에서는 좀더 심화되고 미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 되어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볼 때 [추격자]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은 분명 센스와 실력을 겸비한 좋은 감독이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장편 데뷔작이라는 정말 바늘 구멍 뚫기도 힘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분명 장편 영화의 메가폰을 쥐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할 영화 학도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로또와 같은 큰 기회다.
분명 흥행에 성공하고 평단의 호평도 일구어 냈지만 정작 감독 자신은 이 영화를 다시 보며 만족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연출이 가능한 감독이라면 분명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법'을 이해한 똑똑한 학생의 잘된 과제물 정도의 영화를 보고 아쉬울 것이다.
각박한 한국 영화판 실정 안에서 엄청난 부담과 여러 사람의 요구를 채워야할 의무가 분명 있었겠지만 좀더 욕심을 내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영화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만큼은 감독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했으면 정말 한국영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명세 감독의 [인정 사정 볼 것 없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의 독특한 해석을 특유의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또한 외국에서 찬사 받는 이유는 비단 '충격적'인 영상과 내러티브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한국적인 새로운 영상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어필할 수 있는 이유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은 '중산층' 소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격자]에서 이러한 '특유'와 '오리지널리티'는 실종되고 10년 전부터 수없이 보아 왔던 모습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만 보고 우리만 즐기려 한다면 큰 문제 없을 테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바라본다면 진부한 영화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근대, 현대화 이후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남대문까지 날아가버린 상황에서) ,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명 사회에 있어 전대 미문의 미로 속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좀더 자신을 더 내보여야 하는게 아닐까?
나홍진 감독, 이런한 맥락에서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본다.
728x90
반응형
'CINEMA > Cinematheq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차원적 인간이 감히 다차원적 삶에 물음을 던지다 (0) | 2008.03.10 |
|---|---|
| [아주르와 아스마르]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디즈니 보다는 이 영화를 보여 주세요~! (5) | 2008.02.26 |
| [3:10 투유마] 자본 주의의 테두리에 갇힌 현대인의 모습을 서부극에 투영하다. (2) | 2008.02.23 |
| [스파이더위크가의 비밀]추억의 도시락 먹는 기분의 영화+극장에선 커튼 닫고 나가자! (0) | 2008.02.21 |
|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영화와 관객이 싱크 될 때 극장이란 공간은 무한해 진다~~ (0) | 2008.02.20 |